[도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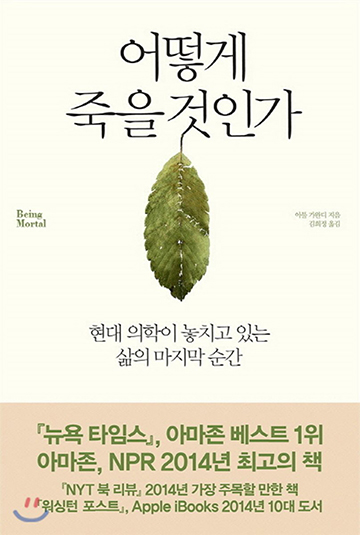
생각 하나.
3년 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내 생애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가족의 죽음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하기에 딱히 진지하게 고민할만한 이유가 없었다. 분명 그랬다.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외할머니의 부고를 전해 듣고서도 한동안 실감하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장례식장에서도 사흘 동안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발인할 때쯤에서야 눈물을 터뜨렸다. 외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3일을 보내며 내가 느꼈던 건 죽음의 무게였다. 그건 달리 말하면, 삶의 무게이기도 했다.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신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그제야 알았다. 아툴 가완디의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읽으면서, 그 때의 일이 많이 생각났다. 사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사례는 내 외할머니의 경우와 다소 거리가 있긴 하다. 이 책에 실린 몇몇 극단적인 사례와 비교해보면, 외할머니께서는 비교적 평온한 임종을 맞이하셨다. 다만 그럼에도 계속 마음에 남는 한 가지 아쉬움은, 외할머니께서 영면하시던 그 순간까지도 우리 가족은 외할머니께서 원하시던 삶과 죽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마 ‘죽음’에 대해 언급하길 꺼리는 우리 고유의 관습 때문이었을 것이다.과연 외할머니는 당신께서 바라셨던 형태의 죽음을 맞으셨던 것일까? 요즘에도 가끔 궁금해 지곤 한다.
생각 둘.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려야지’ 어릴 적부터 줄곧 그려왔던 내 죽음의 모습이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비장에 찬 예술가의 결의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다. 단지 ‘늙어서 은퇴하면, 시간이 남아돌 테니 그때 가서 마음껏 해보고 싶었던 걸 해봐야지’라고 생각했을 따름이다. 그런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을 읽으면서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엔 창작과 같은 정신적인 활동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점점 더 잘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스필버그나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거장들이 70이 넘은 나이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며 당연하게 여긴 적도 있었다. 물론 지금은 그것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체감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도 서서히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닮아갈 것이다. 펜이나 붓, 아니 어쩌면 자판 치는 일조차도 버거운 날이 올지도 모른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나니 지금까지의 인생관이 살짝 흔들렸다. 젊음과 건강을 소중히 여겨야지. 젊고 건강한 이 순간을 최대한 누려야지. 이 책의 저자가 말하려던 게 이런 이야기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책의 내용을 곱씹을수록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죽음이나 늙음에 대해 고민하기엔 난 아직도 많이 젊다. 갑자기 외할머니가 보고 싶어졌다.